북큐레이션
- 홈
- 독서공감
- 사서추천도서
- 북큐레이션
독서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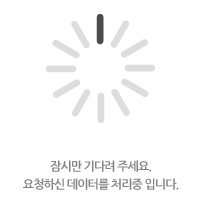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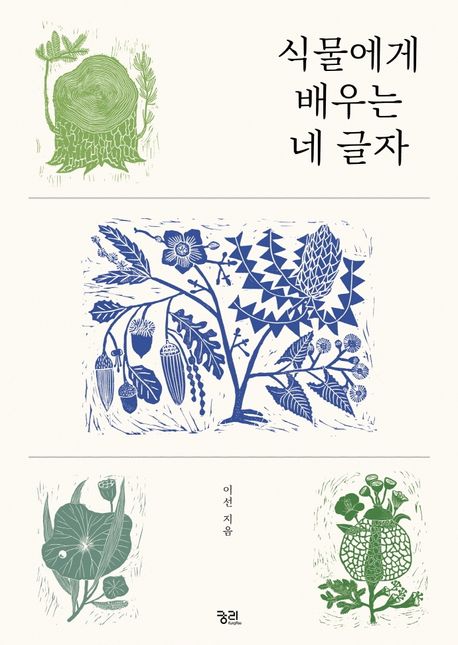
-
식물에게 배우는 네 글자
- 년.월 : 2024년 3월
- 저 자 : 이선
- 출판사 : 궁리
- 출판년도 : 2020년
서평정보
식물생태학 박사와 함께하는 매혹적인 식물 인문학
꽃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당신들 중에는 누가 진짜인가요?”
식물이 말하는 네 글자, 사자성어로 배우는 ‘자연스런’ 삶과 철학!
이 책 『식물에게 배우는 네 글자』는 전통 조경공간과 자연유산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책을 발표하고 한국조경학회 우수저술상을 수상한 이선 교수의 신작이다. 저자는 산과 들로 쏘다니며 오랫동안 식물을 접하며 살았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을 살피며 매번 떠오른 생각은 인간세상과 식물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다. 식물들이 사는 모습이 우리 인간사회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면서 속담이나 사자성어로 식물사회를 조명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 책을 집필의 시작하였다.
“이 책의 출발점은 10여 년 전 학생들과 함께 답사를 하러 갔던 경남 하동 송림이었습니다. 송림을 거닐다 우연히 쳐다본 하늘에 소나무의 수관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를 뻗은 모습에서 ‘누울 자리를 봐가며 발을 뻗는다’라는 속담이 바로 떠올랐지요. 식물들이 사는 모습이 우리 인간사회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면서 속담이나 사자성어로 식물사회를 조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을 쓰게 된 단초였습니다. ‘누울 자리를 봐가며 발을 뻗는다’라는 속담에 부합되는 사자성어 ‘양금신족(量衾伸足)’이 이 책의 시작인 셈입니다.” - 저자 인터뷰 중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식물을 주제로 한 책들이 대부분 식물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 책은 식물사회와 인간사회를 비교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저자는 재치있는 식견으로 때로는 네 살배기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꾸밈없이 순수하게, 때로는 교감 선생님의 훈화처럼 매섭지만 따뜻하게, 식물과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 눈길이 간다.
“식물의 잎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기공(氣孔)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숨구멍이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우리의 입 모양과 흡사합니다. 만약 식물이 그 잎으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하는 상상 속에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마치 제가 ‘식물의 대변인’이나 ‘식물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식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이야기도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 저자 인터뷰 중에서
본문은 ‘1부. 서로 사랑하기’, ‘2부. 모두 함께 살기’, ‘3부. 끝내 살아남기’, ‘4부. 다시 돌아보기’로 총 4부 24가지의 사자성어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본문을 구성하기 위해 사자성어를 찾고 공부해가며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가 식물사회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경우가 무척 많아서 놀라웠다고 한다. 또한 ‘창이미추(瘡痍未?)’와 ‘모릉양가(摸?兩可)’ 등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더한층 깊은 생각하고 사유를 할 수 있는 사자성어들도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고 말한다. 독자들 역시 이 책을 통해 식물이 우리에게 던지는 24가지 화두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식물이 우리에게 던지는 24가지 삶의 화두!
비익연리(比翼連理) / 수상개화(樹上開花) / 시우지화(時雨之化) / 과유불급(過猶不及) / 근고지영(根固枝榮) / 애별리고(愛別離苦) / 초록동색(草綠同色) / 양금신족(量衾伸足) / 상생상멸(相生相滅) / 타인한수(他人?睡) / 세한송백(歲寒松柏) / 공존공영(共存共榮) / 각자도생(各自圖生) / 고군분투(孤軍奮鬪) / 수적석천(水滴石穿) / 적자생존(適者生存) / 도광양회(韜光養晦) / 무위자연(無爲自然) / 고사내력(古事來歷) / 창이미추(瘡痍未?) / 사회부연(死灰復燃) / 지족지계(止足之戒) / 신언서판(身言書判) / 모릉양가((摸?兩可)
“우리의 속담이나 사자성어는 옛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지혜와 통찰이 담긴 절묘한 표현으로 많은 부분이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자연현상을 빗대어 인간사를 비유해왔습니다. 식물도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고 갈등하며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사자성어 중에는 어리석음을 경고하거나 교활함을 경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식물세상에서는 그러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니, 인간세상보다 더 정직하고 공평한 세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어머니께서는 늘, ‘남을 보고 깨치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나무를 보고 깨치거라’로 들립니다. 이래저래 식물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 본문 중에서
